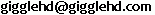제 첫 x86 디바이스는 삼성에서 나온 센스 630 이라는 노트북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 저거로 스타크래프트를 아버지와 함께 10분 15분씩 하던 기억이 나네요. 특이하게도 집에 컴퓨터는 없었고 저 노트북만 하나 달랑 있었습니다. 그 옛날부터 노트북과 꽤 친숙하게 자라온 저는 이 시점까지 자라오면서 윈도우 노트북과 인연이 깊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맥과는 인연이 없기도 하겠구요.
맥북. 듣기만 해도 돈이 철철 넘치는 사람만 쓰고, 디자인 종사자만 쓰고, 기타 특이 직종에 서식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색의 중요성으로 인해 맥을 사용하고 있구요. 거기에 Final cut Pro X라던가 Logic Pro와 같은 애플 독점 소프트웨어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맥 환경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독점체제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쁩니다.
몇년을 봐도 질리지 않는 구형 맥북의 디자인과 얼마 바뀌지 않은 신형 맥북은 과하지 않은 치장과 재질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은 꼭 저 직종이 아니더라도 한번쯤 사서 써보고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개발자 꿈나무였던 제가, 그 맥북을 사보기에 이르릅니다. 애플 공홈에 가서 가격을 쳐다보았고

흉악한 가격표에 뒤로가기를 눌렀습니다. 당시 최대로 끌어모은 돈이 약 200만원 가량이었고, 쿼드코어에서 헥사코어로 확 뛰어오른 2018년형과 2017년형 가격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것을 보고 2018년형 중고를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1TB 모델이 220에 올라온것을 봤고, 질러버렸습니다.

처음 덮개를 올릴때의 그 감각은 아마 재질감에서 오는 단단한 무게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던 노트북이 올웨이즈 92018년형이었고, 나름 만족하며 쓰고 있었거든요. 부드럽게 올라가며 사용자가 편할 위치에서 멈춰주는 힌지는 꽤나 만족스러운 첫 경험을 선사하였습니다. 노트북을 들어올릴때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힌지무게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만족시켰거든요.
그렇게 자판을 쳐봤습니다.
단점 1. 적응이 필요한 자판.
재질이 가져다주는 고급스러운 시야감과는 별개로 이건 "적응" 이 필요했어요. 제가 아무리 갈축 키보드를 하나로 7년째 쓰고있고, 이게 너무 만족스럽고, 스트로크가 낮은 키보드를 싫어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펜타그래프를 쓸때 " 엥 그거 왜쓰냥? 기계식이 짱 아니냐? "라고 할 만큼 개인의 취향을 무시할만큼 나쁜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의 호불호는 있는거니까요. 그런데 전 이 키보드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아무런 설명서도 없이 달랑 디바이스 하나만 던져줘도 누구나 잘 쓸 수 있던것과는 정말 별개의 일이었어요. 지금 약 두 달 넘게 써보고, 드디어 이 키보드에 적응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느낄만큼 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뭘 의도한건진 알겠어요. 그 의도 그대로 썼을 경우 꽤나 고급진 키감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키를 누르는 손가락의 각도도 제각각이고, 누르는 힘도 제각각인데 일단 한 80% 사용자는 만족할 수 있으니 내놓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키보드를 쓰면서 바뀐 생활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손톱을 짧게 다듬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길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키감이 안나오더라구요. 너무 길진 않지만 그래도 아예 안남기는건 아닌 정도로만 자르고 있었는데 이 노트북을 쓰고서 손톱을 아주 깔끔히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거라면 좋은 것이고, 나쁜거라면 나쁜거겠네요. 그러고나니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키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나서 터치바를 봤습니다.
애매한 포인트 1. 터치바
뭐요? 내 esc가 촉감이 없다 그말인가? 아, 유저들 당신은 앞으로 촉감을 느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esc가 터치입니다. 한 줄을 통일감있게 터치바로 만든데에는 심미적인 이유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줄 전체에 뭔가 하나 동떨어져 있으면 일단 미워보일 수 있고,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요. esc바 자체가 크기가 참으로 애매한 친구이기도 하고. 이게 터치바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터치바에 올라가는 정보의 양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걸 하나 잊은 것 같았습니다.
맥북프로는 생산성 기기라는걸요. 그리고 esc는 꽤 생산성에 중요하다는걸요. 어느 누가 이 비싼돈을 주고 소비용 기기라고 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GPU 타겟도 다르니까요. 일반 소비용 기기에 이랬다면 아마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쁘니까요. 그런데 생산성에 중요한 키를 저렇게 빼 놨다는것은 아마 디자인팀의 입김이 엔지니어링 팀의 입김보다 강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참으로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바에 올라가는 정보는 이미 대부분의 유저들은 십수년간 x86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대부분 화면상에서 처리할 것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도 결국 Xcode 상에서 디버그시 코드 실행버튼 딱 하나 쓰고 제대로 써본적이 없는 것 같네요.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어떤 환경에서도 정밀한 컨트롤로 화면 밝기의 조절과 볼륨 조절, 한/영 여부를 언제나 볼 수 있다 정도겠지만 저라면 그냥촉감있는 키보드 쓸래요.
단점 2. 볼륨 믹서의 부재
윈도우에선 정말 당연한 기능이었습니다. 볼륨 믹서를 통해 조절하고, 그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프로그램 내부에서 한 번 더 조절하구요. 주로 줄여도 큰 상황에서 두 인터페이스 모두 줄여서 쓰고있는데 맥에선 그런게 없습니다. 사실 이걸 왜 알았냐면, 카톡의 알림음이 너무 컸어요. 그렇다고 아예 죽이자니 카톡 알림은 청각으로 받고 싶은데, 어디 볼륨조절이 없나 하고 기웃거렸는데도 안보이더라구요. 한참을 기웃거리다 도저히 못찾아서 이런 기본기능도 구글링하는 바보가 있을까? 하며 구글링을 했고, 맥엔 그런게 없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저말고도 이런 기능을 원했던 사람이 꽤 많았는지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원하는 모습을 보고 좀 그랬습니다. 윈도우에선 당연했던 기능이 여기선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사야된다니, 참 애매하죠. 아무리 감성이 넘치고 이쁘고 통일감이 들어도 기본적으로 컴퓨터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되는데 망각한 듯 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패치땐 넣어주려나요. 생색내면서요.
(볼륨 믹서가 없어 사진도 없습니다)
단점 3. 오피스를 많이 쓰신다구요? 그럼 당신은 윈도우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습니다. 이말인즉슨, 맥에서 Pages나 Final cut Pro X가 넘사벽의 최적화를 보여주듯 윈도우에서 오피스가 정말 잘 돌아갑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맥에선 오피스가 뭔가 애매하다는 뜻이겠죠.
워드나 엑셀의 크기가 조금만 커진다면 순식간에 입력이 느려집니다. 막 느린건 아니지만, 마치 예전 태블릿의 터치펜이 따라오는 속도가 느껴지듯 딱 그정도의 속도가 느껴졌어요. 불편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생산성에 지장을 받는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신경쓰이는것도 사실이에요.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문서처리가 오피스, 혹은 아래한글로 이뤄진다는 점을 보면 아마 오피스를 "매우 자주"사용해야 한다는 사람이라면 맥보다는 차라리 델 XPS 라인을 사는게 어떨까 싶네요. 아니면 삼성 갤럭시북 이온 라인을 사거나요. 더 아니면 그램을.
단점 4. usb-c 로의 강제적 이주
사용자 대부분 usb-c 가 편하다는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보한 기술임에도요. 그리고 언젠가 A 타입은 멸종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트북 제조사들은 여전히 A 타입을 달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여서일까요? 아니죠. 지금 당장 사용되는 디바이스들이 A 타입 위주로 돌아가니까요. 한번 정착된 레거시 시스템은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거시 지원을 확확 끊어내면서도 성공적인 이주를 행하는 애플이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될 정도로 기존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원은 늘상 딜레마 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내가 한다면 따라온다는 자신감이 넘쳤는지 2016년부터 모든 인터페이스를 썬더볼트 3로 바꿔버립니다. A 타입은 모조리 제거한 채로요. 그리고 C to A 변환 젠더를 2.5만원에 팔면서요.
아직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를 끼워준다면 몰라도요. 결국 뭔가 제대로 해보려면 허브 하나는 필수적으로 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브는 여간해선 비싼 모델들입니다. 분명 썬더볼트는 매력적이고, 그 단자가 많이 달리면 좋지만, 그렇다고 A 타입을 없애란건 아니었는데, 좀 그렇네요.
단점 5. 2018 버전 한정 너무나도 부족한 배터리타임
2014버전에서 2018로 올라오며 너무나도 크게 역체감했던것이 바로 배터리타임 이었습니다. 중간에 삼성 올웨이즈 9을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맥북의 배터리타임은 제게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노트북이라면 당연히 휴대용. 휴대용이라면 당연히 어느정도 버텨야지 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맥북은 그 생각을 철저히 부숴주었습니다. 물론 휴대가 불가능한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긴 작업을 한다면 당연히 AC 어댑터를 가져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비행기에 탔을때 이 기기로 생산활동을 하려고 하신다면, 아마 장거리에서는 보조배터리가 필수이지 않을까싶습니다.

이 사진은 현재 기글에 글을 작성하며 측정한 배터리타임입니다. 배터리의 60퍼센트가 남았고, 1시간 반 정도가 남았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뭐가 그리 급한지 박대리씨는 늘 조기퇴근을 외칩니다. 정말 빡빡히 쓰고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좀 낮춘다면 3시간 반에서 4시간정도 가겠지만 평균적으로 2시간 이상의 야외작업 시에는 늘 AC 어댑터를 지니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점만 말하면 정없으니 장점도 말해봅시다.
장점 1. 16대 10의 유니크한 화면비, 그에따른 생산성
예전에는 16대 10 노트북이 꽤 많이 나왔는데 이젠 16대 9 노트북이 윈도우 시장의 주류입니다. 아마 16대 10 화면비를 고집하는건 애플 하나일거에요. 자기네들이 구축해놓은 생태계에 고립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오히려 생산성의 증대와 함께 맥북을 좀 더 생산성 기기로 각인시키는데에 일조하지 않았나 싶더라구요. 코드를 몇 줄 더 보기 위해 피벗 모니터를 사고, 해상도를 늘리고 하는게 일상이었는데 단 몇 줄 차이로 이렇게 쾌적하게 개발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편했습니다. 단순 텍스트 파일을 편집하더라도, 웹 사이트를 들어가더라도, 어느곳에서나 세로가 길다는것은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물론 소비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의 컨텐츠가 16대9 기준, 혹은 21대 9까지도 나오는 상황에서 16대 10이라는 시대를 역행하는 화면비는 오히려 소비에 불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대부분의 생산활동만을 여기서 했고, 소비활동은 32인치 모니터가 달린 윈도우 데스크탑에서 했기에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장점 2. 사이드카의 유혹
사이드카는 이번 카탈리나 패치로 올라오며 중점적으로 홍보했던 기능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아이패드와 맥북이 모두 요구조건을 만족했다면, 별 다른 제어 없이 같은 와이파이망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무선 디스플레이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이전에도 twomon같은 제품들이아이패드를 보조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애플 공식지원은 카탈리나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무선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애플이라는 것을 보여주듯 당연히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였다면 별로 그저그런 기능이었겠지만, 꽤 부드럽고 레이턴시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제시 보통 한 화면에 코드와 과제 요구사항을 동시에 띄워놓는다면 참으로 크기가 애매해집니다. 그러한불편함을 마치 가려운 부분만 탁 긁어주듯 나온 사이드카는 참으로 편한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탈리나가 버그가 많다고 까지만, 그러면서도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카탈리나 에서만 지원하는 기능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일단 저도 그렇거든요.
장점 3. APFS 의 "적절한" 파티셔닝.

애플은 APFS 라는 자체 개발 파티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순수히 만든건지, 아니면 유닉스 시스템을 개량해서 내놓은건진 전 거기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Apple File format system이라니까, 애플이 만든거겠죠. 그리고 이 파티션은 꽤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두 개의 파티션이 한 공간을 같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윈도우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트윅으로 부팅용 파티션을 따로 잡고, 그 외의 파티션에 각종 자료들을 넣어서 혹시 모를 포맷이 필요할 때 부팅 파티션만 정확히 날려버리고, 다시 깔면 나머지 데이터들은 백업 걱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선 당연하다는 듯 두 파티션은 설정시에 몇백 기가, 몇백 기가 정도로 사용자 입맛에 맞추어서 넣어두고는 했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파일의 운용법이었어요. 그런데 맥은 그런거 없다는듯 필요한 만큼, 차지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한참 고민하신다면, 아마 위의 사진이 그 해답일 것 같네요. MacSSD 라는 파티션 안에 데이터 파티션과 일반 파티션을 만들었습니다. 원한다면 데이터 파티션을 날리지 않고 포맷하는것이 가능하구요. 마치 가상머신에서 동적 디스크 할당을 쓰는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장점 4. UNIX 베이스라고 주장하는 키보드
최근 Linux 수업을 들으며 한가지 난해했던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없는 기호를 조합해서 탈출하고, 실행하는 것이었죠. 윈도우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cmd 창을 켜서 컨트롤 C 를 누르면 아마 이상한 기호가 생겨날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대부분은 그냥 이상한 기호구나라고 치부해버리고 닫아버리죠.
맥북에 오며 가장 처음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 기호가 키보드에 박혀있다는 점 이었습니다. 리눅스에서 nano는 기본적으로 설명서가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데, 컨트롤키가 바로 저 ^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 하는사람들이라면 검색을 하고 탈출하겠지만 전 그냥 키보드를 슥내려보고 "아 컨트롤과 어떤 키를 누르면 탈출이 되는구나" 라고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정말 쓸모없고, 정말 생활에 붙어있는 기능이어서 당연한 매칭이었겠지만 처음 사용하는 사람에겐 저런 사소한 배려가 좋았습니다.
이렇듯 단점과 장점이 참으로 많은 맥북입니다. 누군가는 돈아깝다. 그 돈으로 윈도우 노트북을 사면 얼마나 더 높은 스펙을 살 수 있는데 맥을 사냐 라고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맥만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영상, 혹은 출판업계에 있지도 않은데도 말이죠. 그렇게 꾸준한 팬층이 있는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고, 또 만져보면 알 수 있는 맥북의 만듦새나 칼마감, 그리고 들었을 때 내부가 꽉 들어찼다는 느낌을 한눈에 주기도 합니다. 분명히 매력적인 기기이고, 윈도우 노트북만 20여년간 만져본 저이지만 맥을 사용할 수 있다면 꼭 써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터치패드 참 좋네요.










 WF-1000XM3와 에어팟 프로에 대한 개인적인 비교
WF-1000XM3와 에어팟 프로에 대한 개인적인 비교